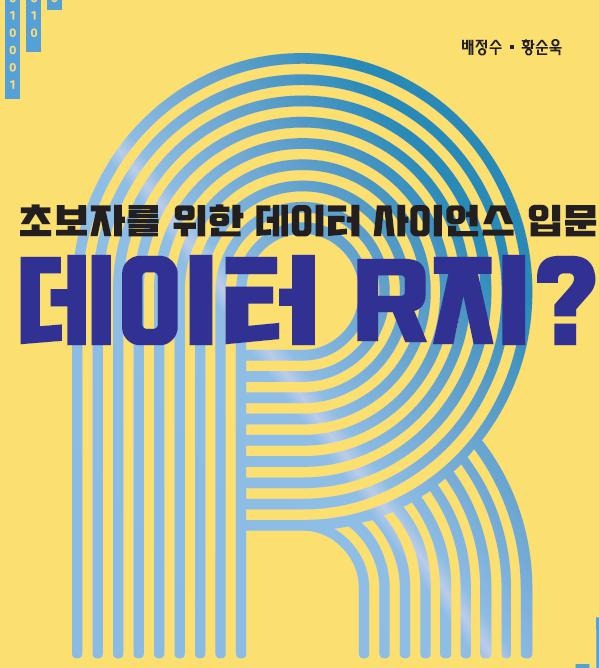티스토리 뷰
학습목표
- 스마트폰의 발전 과정과 운영체제(OS)의 특징을 이해한다.
- 드론(Drone)의 정의와 핵심 기술, 최신 트렌드를 파악한다.
- 3D 프린터의 원리, 주요 출력 방식,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 세 가지 디바이스가 디자인·예술과 어떻게 융합되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1. 스마트폰(Smartphone)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하였다. 2000년대 초반 피처폰은 전화·문자 위주의 폐쇄적 서비스였으나, 2007년 아이폰과 2008년 안드로이드의 등장은 앱스토어와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내며 모바일 혁명을 일으켰다.
오늘날(2025년) 스마트폰은 AI 비서, AR/VR, IoT 연동까지 지원하며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 운영체제 특징
-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기반, 다양한 제조사 사용, 파편화 문제 존재.
- iOS: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나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강세.
- 디자인 측면
- 구글의 Material Design과 애플의 HIG(Human Interface Guidelines)는 글로벌 디자인 표준으로 자리잡음.
- 카드 기반 레이아웃, 미니멀리즘 UI, 제스처 인터랙션 등은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을 구현.
- 예술과의 융합
- 스마트폰은 ‘손안의 아틀리에’로, 누구나 사진·영상·음악을 제작할 수 있는 창작 도구가 됨.
-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은 새로운 디지털 갤러리로 기능하며, 참여형 예술 생태계를 형성.
- AR 필터 아트, 위치 기반 예술은 도시 전체를 스마트폰 기반 미술관으로 확장시킴.

- 2000년대 초반 – 피처폰 시대
이 시기는 전화와 문자 서비스가 중심이 되었으며, 벨소리 다운로드나 단순 게임 같은 부가 기능이 추가된 정도였다. 통신사가 폐쇄형 서비스를 주도하던 시기로, 모바일 기기는 주로 ‘통신 도구’의 역할에 머물렀다. - 2007년 – 아이폰 등장 (iOS)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모바일 환경에 혁신이 일어났다. 앱스토어와 멀티터치 인터페이스가 도입되어 기존 휴대폰과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모바일이 단순한 통신 기기에서 생활의 중심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 2008년 – 안드로이드 출시
구글이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선보이면서 삼성, LG, 샤오미, 오포 등 다양한 제조사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 2010년대 – 스마트폰 대중화
스마트폰은 일상 속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며, SNS, 모바일 결제,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용자들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참여하는 주체로 변모하였다. - 현재 (2025년) – 모바일 생태계 고도화
오늘날 스마트폰은 단순한 앱 실행기를 넘어 AI 비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연동과 같은 첨단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유튜브, 틱톡 등 플랫폼을 중심으로 UGC(User Generated Content) 문화가 정착하면서, 모바일은 창작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대한 생태계로 성장하였다.
피처폰 시대와 스마트폰 시대의 변화
“통신 중심 도구 → 생활 플랫폼 → 창작·참여형 생태계”


스마트폰의 등장은 모바일 환경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과거의 피처폰은 단순히 통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으나,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통신 기기에서 생활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다. 피처폰 시대에는 전화와 문자, 벨소리 다운로드, 단순한 게임과 같은 제한된 기능만 제공되었다. 당시 휴대전화는 오직 통신 중심의 기기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화는 오히려 부가기능이 되었고, 애플리케이션(App)을 중심으로 금융, 쇼핑, 교통, 예술 감상, 창작 활동까지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발전하였다. 스마트폰은 이제 개인의 일상 전반을 관리하고 확장하는 필수 매체로 자리잡았다.
둘째, 하드웨어 중심에서 운영체제(OS) 중심으로의 변화이다. 피처폰 시절에는 노키아, 모토로라, 삼성, LG와 같은 하드웨어 브랜드가 시장을 지배하였다. 소비자들은 기기의 디자인과 성능을 기준으로 휴대폰을 선택하였으며, 경쟁 역시 하드웨어 우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반면 스마트폰 시대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Android)와 애플의 iOS가 시장의 핵심이 되었다. 하드웨어의 차별성보다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경쟁과 생태계 확보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 것이다.
셋째, 폐쇄형 서비스에서 개방형 생태계로의 전환이다. 피처폰 시대에는 각 통신사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제한적 콘텐츠만 이용할 수 있었다. 벨소리 다운로드나 특정 통신사 전용 게임처럼, 사용자 선택권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에는 앱스토어(Apple App Store)와 구글 플레이(Google Play)가 등장하여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모바일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의 등장은 이용자의 경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과거 피처폰 시절에는 사용자가 음악이나 영상을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재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수동적인 소비 행위에 불과하였으며, 사용자는 제공된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에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프로슈머(Prosumers: 생산자+소비자) 개념을 강화하였다. 2000년대 중반의 UCC(User Created Contents) 시대에는 개인이 만든 동영상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으며, ‘UCC 열풍’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어 2010년대 이후에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 시대로 발전하면서, 동영상뿐 아니라 SNS 글, 사진, 라이브 방송까지 모든 형태의 사용자 생성물이 디지털 생태계의 중심이 되었다. 이는 사용자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며, 모든 사람이 동시에 창작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새로운 참여형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기기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피처폰 시대에는 전화기, 카메라, MP3 플레이어,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기를 각각 별도로 소지해야 했다. 기능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장치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이러한 다양한 기기의 기능을 하나의 디바이스로 통합하였다. 즉, 분리된 기기가 하나의 융합형 기기로 집약되면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로 통신, 촬영, 음악 감상, 길찾기, 심지어 창작 활동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통신 중심 기기에서 생활 플랫폼으로, 하드웨어 경쟁에서 소프트웨어 생태계 경쟁으로, 폐쇄형 서비스에서 개방형 혁신 구조로 전환되며, 현대 사회의 필수적 디바이스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용자의 생활양식과 창작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표적인 모바일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와 디자인 특징

안드로이드는 구글(Google)이 개발한 모바일 운영체제로, 2008년 처음 출시되었다. 오픈소스(Open Source)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삼성, 샤오미, 오포, LG 등 다양한 제조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안드로이드가 빠르게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가격대의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제조사 및 사용자 모두에게 열려 있는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이다. 이러한 개방성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확산을 촉진하였다. 반면, 제조사와 기기별로 기능과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앱 최적화가 어렵고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힘든 “파편화(fragmentation)”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바일 운영체제로 자리잡았다.
안드로이드 디자인은 “머티리얼 디자인(Material Design)”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머티리얼 디자인은 직관적이고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디자인 시스템으로,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 카드(Card) 기반 레이아웃: 정보를 카드 형태로 구분해 가독성과 시각적 명확성을 높인다.
- 색상 시스템(Color Palette): 기본 색(Primary), 보조 색(Secondary), 강조 색(Accent)으로 구분하여 통일감과 시각적 위계를 제공한다.
- 플로팅 액션 버튼(FAB, Floating Action Button): 화면 위에 떠 있는 원형 버튼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을 강조하여 사용자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안드로이드는 개방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조사와 이용자를 포용하며, 머티리얼 디자인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된 사용자 경험을 지향한다.
iOS – HIG (Human Interface Guidelines)

iOS는 애플(Apple)이 개발한 모바일 운영체제로, 2007년 첫 아이폰과 함께 세상에 공개되었다. 안드로이드와 달리 폐쇄형(Closed System)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오직 애플의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적 구조는 사용자 자유도를 낮추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높은 안정성과 보안성을 제공한다는 강점을 가진다.
iOS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애플이 직접 통합적으로 설계·관리하기 때문에, 기기 성능과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뛰어나며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반면, 애플 기기는 대체로 가격대가 높아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약 25%를 차지한다.
iOS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HIG(Human Interface Guidelines) 이다. HIG는 애플이 제시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원칙으로,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사용자 친화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디자인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 미니멀리즘 디자인(Flat Design, Clear Design): 불필요한 장식을 최소화하고, 단순하고 깔끔한 시각적 표현을 추구한다.
- 일관된 인터페이스 패턴 제공: 네비게이션 바, 탭 바, 버튼 등 정형화된 디자인 요소를 통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스처 기반 인터랙션: 스와이프, 핀치 확대/축소, 드래그와 같은 손동작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강조하여 물리적 조작의 자연스러움을 디지털 환경에 구현한다.
즉, iOS는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운영체제이며, 폐쇄적이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생태계와 일관된 디자인 철학을 통해 글로벌 모바일 디자인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왔다.
스마트폰 시대와 디지털 아트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 창작의 도구이자 전시의 무대로 자리 잡았다. 누구나 손에 스마트폰을 쥐는 순간,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첫째, 스마트폰은 손안의 아틀리에(Atelier) 이다. 사진 촬영, 영상 편집, 음악 제작, 드로잉 등 과거에는 전문 장비가 필요했던 창작 활동을 스마트폰 앱만으로 손쉽게 실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디지털 드로잉을 지원하는 Procreate Pocket이나 음악 제작 앱인 GarageBand가 있다. 이러한 앱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즉시 작품을 제작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은 곧바로 창작과 발표가 가능한 즉시성의 아틀리에로 기능하고 있다.
둘째, SNS 플랫폼은 디지털 갤러리로 변모하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개인이 제작한 영상, 밈(Meme), 필터 아트 등이 곧 전시 작품이 된다. 전통적 갤러리에서 큐레이터와 평론가가 작품을 걸고 평가하던 방식과 달리, SNS에서는 ‘좋아요’와 ‘댓글’이 관객의 참여형 피드백이 된다. 이는 관람자가 단순한 감상자에서 벗어나, 작품에 직접 반응하고 소통하는 참여형 예술 경험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미술관이나 전시장의 벽은 모바일을 통해 허물어졌다. 스마트폰 속 SNS는 누구나 언제든지 작품을 올리고 감상할 수 있는 무한한 디지털 전시장으로 기능한다. 이는 예술이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일상 속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보여준다. 즉, 스마트폰은 제작의 도구이자 전시의 무대로서, 디지털 아트의 창작과 향유 방식을 동시에 혁신하였다. 예술은 이제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용자가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창작과 전시를 넘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면서 예술 표현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켰다. 특히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 기술은 스마트폰을 매개로 예술을 현실 공간 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첫째, AR·VR과의 융합이다. 스마트폰 카메라와 AR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가상의 예술 작품을 현실 공간 위에 덧씌울 수 있다. 예를 들어, AR 필터 아트는 얼굴이나 배경을 즉시 작품으로 변환시켜 일상적인 모습 자체를 예술적 경험으로 바꾼다. 또한, 스마트폰을 VR 헤드셋과 연결하면 가상의 갤러리를 체험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몰입형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이는 관람 경험을 물리적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시키며, 예술 향유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장시켰다.
둘째, 위치 기반 아트(LBS + 아트)이다. 특정 장소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화면에만 보이는 AR 작품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현실의 지리적 맥락과 디지털 콘텐츠가 결합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포켓몬 고(Pokémon Go) 와 같은 위치 기반 게임에서 착안한 “지역 기반 예술 탐험”이 있다. 미디어 아티스트들은 도시 전체를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거대한 미술관으로 바꾸며, 관객이 직접 이동하고 참여하는 체험형 예술을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AR·VR, 위치 기반 서비스와의 융합은 예술을 단순히 감상하는 대상을 넘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참여적 경험으로 전환시켰다. 스마트폰은 이제 창작 → 공유 → 전시 → 체험이라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디지털 아트의 핵심 매개체로 자리매김하였다.
360° VR Spacewalk Experience | BBC HOME
https://www.youtube.com/watch?v=hEdzv7D4CbQ
NASA의 훈련 프로그램과 우주비행사들의 놀라운 경험
- Total
- Today
- Yesterday